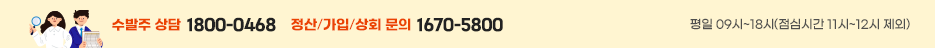
 관리자
관리자

서울 중구에 있는 A 한식당은 2대째 이어지며 5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지역 대표 노포 중 하나다. 최근 이 식당은 삼겹살을 주문할 때 내던 상추를 식탁에서 내렸다. 일주일에 2~3번 간격으로 제공하던 소시지 반찬도 주 1회로 줄였다. 사장 박모씨는 11일 “상추 한 상자가 10만원을 넘는 등 물가가 급등해 반찬을 예전처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고물가 직격탄으로 음식값을 올리는 대신 손님에게 내놓는 반찬 구성 등을 줄이거나 저렴한 품목으로 바꾸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식당가에 퍼지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슈링크(shrink·줄이다)’와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 상승)의 합성어다. AP통신은 지난 8일(현지시간) 해당 단어를 소개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속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했다.
대기업 등이 몰려 있는 서울 한 식당가에서 갈비탕 등을 파는 B 한식당 측은 최근 반찬 메뉴를 조정했다. 이전에는 반찬이 구성 변경 없이 4종류로 똑같지만 최근에는 원재료 시세를 봐가면서 반찬 종류를 그때그때 바꾸는 식이다. 한 테이블당 5개씩 나가던 고추도 이제는 3개씩 제공한다. B 식당의 사장은 “물가가 너무 올라 반찬 구성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며 미간을 찌푸렸다.
치솟은 식재료 물가로 추가 금액 지급 없이 공짜로 나가는 반찬 등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식당 사장들은 토로했다. 서울 중구 저동 일대에서 35년 넘게 설렁탕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73·여)씨는 “설렁탕 집이라 김치가 짝꿍인데 추가 금액 없이 3~4번씩 리필하는 손님이 꽤 있어 출혈이 크다”고 말했다. 추가 반찬을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식당도 꽤 있다.

자영업자들은 가격 인상 대신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대응 방식이 손님 지키기에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물가 시대 속 살아남는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다. 덮밥 전문점 사장 30대 김모(경기도 성남시)씨는 “당장 가격을 올리는 건 손님 눈치가 보이지만 반찬을 바꾸거나 없애는 건 상대적으로 편한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런 식당가 기류 변화는 손님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40대 공무원 이모씨는 “자주 가던 단골 식당의 첫 반찬 양이 최근 줄어들었다”며 “사장도 사정이 있을 텐데 괜히 더 달라고 하기가 눈치 보인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1·여)씨도 “점심값이 1만원을 넘어가는데 반찬까지 줄어든다고 하면 누가 기분 좋게 점심을 먹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B식당 정기권 이용자인 50대 김모씨는 “요즘 경제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올리는 것보다는 반찬 양이나 가짓수가 줄어드는 게 그나마 낫다”고 말했다.
반찬 리필 금지나 변경 등은 고객 반감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8년 넘게 저동 일대에서 점심때 밥·사리 등을 무한 제공하는 한식당 사장 김종만(48)씨는 “물가를 핑계로 기존 메뉴나 반찬을 바꾼다면 소비자와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일종의 눈속임”이라며 “가격 인상보다 직접적인 부담이 적겠지만, 고객 신뢰 구축에 장기적으로 도움 될지는 업주들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면좋은뉴스'게시판 글
|
쿠궁쿠궁 |
2022.07.12 |
182 |
0 |
|
|
쿠궁쿠궁 |
2022.07.12 |
177 |
1 |
|
|
쿠궁쿠궁 |
2022.07.12 |
175 |
0 |
|
|
쿠궁쿠궁 |
2022.07.12 |
183 |
0 |
|
|
쿠궁쿠궁 |
2022.07.11 |
18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