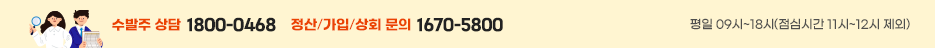
 파트너스회원
파트너스회원
과도한 민원에 ‘신음’
“택배·음식 병실에 갖다 달라” 요구 예사
43% ‘언어폭력’·12% ‘물리적 폭력’ 경험
|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시 현대병원 코로나19 전담병동 중환자실에서 전신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확진 환자를 돌보고 있다. 남양주=하상윤 기자 |
6년 경력의 최선미 간호사(가명)는 “격리구역에서는 치료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 예를 들어 물리치료 같은 걸 요구하시기도 한다”면서 “해드릴 수 없다고 하니 ‘그것도 못해주냐’며 역정을 내셔서 담당 간호사가 울기도 했다”고 전했다. 입원 환자 중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는데 ‘왜 입원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느냐’며 화를 내기도 한다.
격리된 환자에게 개인 물품뿐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 등을 넣어달라는 요구도 많다. 문제는 전달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간호사가 의료기기 하나하나 관리까지 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나 치료 경과 정도만 얘기해줬다면, 이제는 간병인이나 가족이 하던 환자 수발뿐 아니라 세세한 일상까지 전해주는 등 보호자 응대 업무가 배로 늘었다.
|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시 현대병원 코로나19 전담병동 중환자실에서 환경미화원이 전신 방호복을 입은 채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다. 남양주=하상윤 기자 |
강선미 간호사(가명)는 “젊은 환자분들이 ‘왜 빨리 안 해주냐’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 다 아는데 왜 이거 안 챙겨주냐’, ‘식사가 맛이 없다’, ‘택배시킨 거 왜 바로 안 갖다 주냐’고 따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외식을 많이 하던 분들이라 그런지 외부 음식을 넣어달라고 컴플레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코로나 증상 중 하나인 설사나 구토 때문에 식이조절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도 병원 밥 못 먹겠으니 외부 음식 반입해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김재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간호사도 “인터넷에서 샴푸 20개를 주문해놓고 (병실에) 넣어달라고 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여름에는 땡볕에서, 겨울에는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는 임시선별소 사정도 마찬가지다. 권선자 수원병원 임상병리사는 “검체 체취를 위해 바늘을 코에 넣을 때 반사적으로 피하셔서 저희가 엉뚱한 곳을 찌르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그러면 막말을 하신다. 저희도 한 가정의 아내이고, 엄마이고 또 딸이기도 한데 심한 욕설을 많이 하고 가신다. 마음에 안 든다고 CCTV를 부숴놓고 가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가 대한간호협회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환자 또는 환자가족으로부터의 ‘갑질’ 경험 여부’(중복 응답)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3%가 ‘고성,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업무 외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이 34.7%였으며, ‘물리적 폭력(물건 던지기 등)’을 경험했다는 간호사도 11.7%나 됐다.권 임상병리사는 “퇴근하다가 근처에서 장을 보는데 저희 병원에 다니시던 환자분이 저더러 ‘확진자를 보는 사람이 이러고 돌아다녀도 되냐’고 하시는데 정말 섭섭했다”면서 “사실 환자나 가족, 동료에게 피해줄까봐 저희가 더 많이 주의하고, 소독도 더 열심히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중환자실을 지켰던 최유란 수간호사(가명)는 “메르스 때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교감선생님이 아이를 따로 불렀다. 내가 여기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저한테 말을 안 했다. 엄마가 힘들까봐”라면서 “학부모 모임도 배제됐는데 그 마음도 아니까, 이해하려고 한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알면좋은뉴스'게시판 글
|
보람찬하루 |
2021.08.17 |
3,254 |
0 |
|
|
보람찬하루 |
2021.08.17 |
3,208 |
0 |
|
|
대구정플라워 |
2021.08.16 |
3,101 |
0 |
|
|
대구정플라워 |
2021.08.16 |
2,965 |
0 |
|
|
대구정플라워 |
2021.08.16 |
2,923 |
0 |